『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지음 | 문학동네
![[봉쌤의 책방] 기억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 [봉쌤의 책방] 기억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23-1024x607.png)
문득 어떤 장면 앞에서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오래전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듯한 순간, 잊었다고 여겼던 상실이 다시금 가슴을 두드리는 순간 말이다. 우리는 종종 떠나보낸 존재와, 지나간 시간과,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사건과 조용히 마주선다. 그때마다 깨닫는다. 어떤 작별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미완의 작별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 소설은 제주 4·3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도, 그 중심에 아주 조용한 일상의 숨결, 한 사람의 고통, 한 가족의 기억, 한 우정의 흔들림을 놓아두고 있다. 역사를 다루되 역사를 압도하지 않고, 개인을 이야기하되 개인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한강의 문장은 그 경계 위에서 부서지는 파도처럼 섬세하게 흔들리며 독자를 끌어당긴다.
소설의 화자인 경하는 한때 학살을 다룬 책을 쓰며 상처를 떠안은 작가다. 불면과 악몽 속에서 균형을 잃어가던 그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 인선이 손을 내민다. 전기톱 사고로 손가락을 잃고 병상에 누운 인선은, 제주에 홀로 남겨둔 작은 새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긴다. 경하는 폭설을 뚫고 제주로 향하고, 그 여정 속에서 인선과 그의 가족이 견뎌야 했던 4·3의 잔혹한 기억과 마주하게 된다.
한강은 이 여행을 단순한 사건의 재현으로 다루지 않는다. 현실과 환상이 포개지고, 살아 있는 목소리와 죽은 자의 숨결이 겹쳐지는 구조를 통해 ‘기억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묻는다. 4·3의 비극은 단지 연대기 속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남은 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미완의 시간’이다. 이 소설은 그 시간을 다시 조명함으로써, 잊힘이 어떻게 또 다른 폭력이 되는지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보여준다.
작품 곳곳에는 한강 특유의 상징적 이미지가 언뜻 스치듯 떠오른다. 눈보라, 날개짓, 바람, 고요한 방의 낮은 온도 같은 것들. 그것들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생과 사, 기억과 망각을 가르는 얇은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시각화한 장치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목은 바로 이 경계 위에서 태어난 선언이다.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떠나보내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은 존재와 맺었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학적 답변이다.
이 소설은 또한 ‘연대’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 경하와 인선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상처의 깊이를 함께 내려가려는 두 사람의 연대이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조용한 다리다. 역사적 폭력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그 기억의 목격자가 되어주는 순간, 고통은 비로소 말의 형식을 얻는다. 말할 수 있는 고통만이 치유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을 한강은 소설 속 작은 움직임들로 보여준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읽는 내내 마음을 젖게 만드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한강이 보여주는 고통은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진 ‘기억의 윤리’이다. 오래도록 덮여 있던 역사적 상흔을 조명하면서도, 비탄으로 함몰되지 않고 생의 감각을 되살리는 문장. 그것이 이 작품이 지닌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종종 ‘잊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강은 다른 길을 보여준다. 잊지 않는 일, 작별하지 않는 일, 그럼에도 살아가는 일, 그 길 위에서 인간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손길이 바로 오늘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어떤 작별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살아 있다는 뜻이며,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한강의 이 고요한 소설은 그 사실을 가장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속삭인다.
읽는 이의 가슴 한쪽에 오래 머무르는 문장들.
기억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생의 온도.
그것이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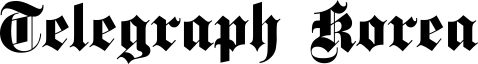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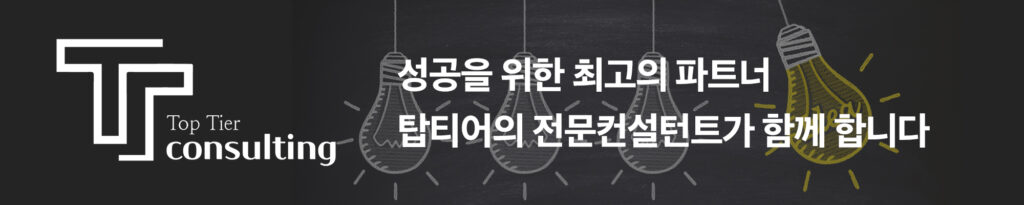
![[기억의 시간] 그들이 남긴 선택, 오늘의 우리는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기억의 시간] 그들이 남긴 선택, 오늘의 우리는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22-1024x589.png)





![[기억의 시간] 나라를 되찾은 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기억의 시간] 나라를 되찾은 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1/image-54-1024x683.png)
![[사설] 책임을 피해간 기업, 시민의 선택은 더 분명해졌다 [사설] 책임을 피해간 기업, 시민의 선택은 더 분명해졌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1/image-53-1024x683.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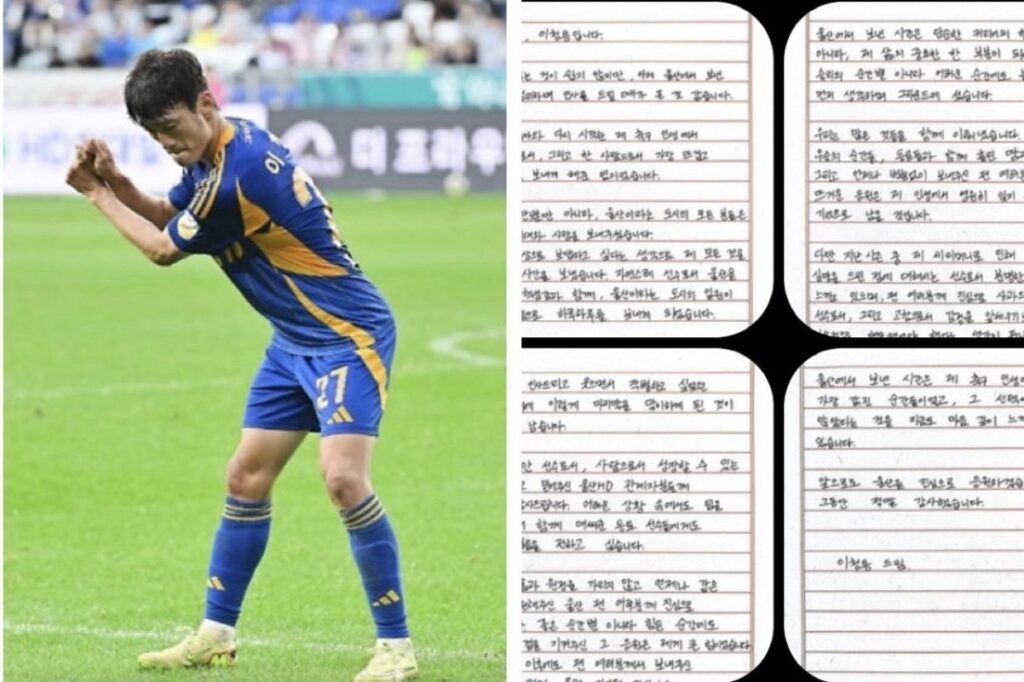
![[사설] 이혜훈 지명 낙마가 남긴 능사능임 인사의 교훈 [사설] 이혜훈 지명 낙마가 남긴 능사능임 인사의 교훈](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1/image-58-1024x68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