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
“나무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사람을 기르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
중국 고전 《관자(管子)·권수편(權修篇)》에 나오는 이 문장은 교육과 인재 양성의 본질을 꿰뚫는 말로 전해진다.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가 열린 경북 김천의 겨울 축구장에서, 이 오래된 문장은 하나의 장면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 장면의 중심에는 서정원 감독이 있었다. 그는 벤치에 있지 않았다. 기술지역에도 서지 않았다. 대신 관중석 한쪽, 그라운드와 벤치가 모두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선택은 의도적이었다. 감독이 아닌, 한 명의 축구 선배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동료를 존중하는 친구로서의 자리였다.
제주관광대학교를 이끄는 임근재 감독과 서정원 감독의 인연은 짧지 않다. 두 사람은 선수 시절부터 대표팀과 프로 무대를 함께 거치며, 한국 축구의 가장 치열한 시간을 나란히 통과해왔다. 포지션도, 역할도 달랐지만 서로의 축구를 가장 잘 아는 존재였다. 경쟁 속에서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다. 서로가 축구를 대하는 태도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뒤에도 두 사람은 같은 길을 택하지 않았다. 서정원 감독은 프로 무대와 해외 리그에서 성과와 책임을 짊어졌고, 임근재 감독은 중·고등학교 현장을 거쳐 대학 축구로 이어지는 육성의 길을 걸었다. 속도도, 무게도 다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서정원 감독은 임근재 감독이 중·고교 현장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며 보낸 시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과보다 과정, 전술보다 태도를 먼저 세우는 방식이 어떤 고독을 동반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심스러웠다. 거장의 이름으로 그 현장에 개입하지 않았다. 아마추어 축구의 공간은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립이야말로 진짜 성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내내 그는 말을 아꼈다. 골이 터져도 과장된 반응은 없었고, 실수가 나와도 고개를 크게 흔들지 않았다. 대신 임근재 감독이 선수들을 바라보는 눈빛, 교체를 고민하는 순간의 정적, 흔들리는 흐름 속에서 팀을 붙잡는 방식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는 평가가 아니라 공감에 가까운 시선이었다.
임근재 감독 역시 수차례 관중석을 올려다봤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같은 벤치에 앉을 수는 없었지만, 같은 경기를 같은 무게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기자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관계는 요란하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다가서지도, 그렇다고 거리를 두지도 않는 사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서로의 시야 안에 존재하는 관계였다.
이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는 서정원 감독의 ‘자기 절제’에 있다. 그는 언제든 중심에 설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물러섰다. 그것이 친구에 대한 존중이었고, 아마추어 축구에 대한 예의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정은 조언의 양이 아니라, 침범하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는 곧 《관자》의 문장으로 되돌아간다. 십년수목, 백년수인. 선수 한 명을 키우는 일은 단기간의 성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유소년과 중·고교, 대학을 거쳐 축적되는 시간과 실패, 반복의 과정을 견뎌야 한다. 임근재 감독이 지켜온 현장은 그 시간의 연속선 위에 있고, 서정원 감독이 관중석에서 바라본 것은 그 긴 여정의 한 장면이었다.

경기 후에도 서정원 감독은 선수들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규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팀의 언어는 임근재 감독의 몫이라는 것을. 대신 몇몇 선수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친구의 제자들에게 건네는 가장 절제된 응원이었다.
그날 김천의 관중석은 단순한 좌석이 아니었다. 프로와 아마추어, 결과와 과정, 완생과 미생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랜 우정을 품은 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축구를 존중하는 한 거장이 앉아 있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언제나 시간을 요구한다. 서정원 감독이 관중석에 앉았던 이유, 그리고 임근재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묵묵히 버텨온 이유는 다르지 않다. 그것은 십년수목이 아니라, 백년수인의 길을 믿기 때문이다. 오래된 우정은 그렇게,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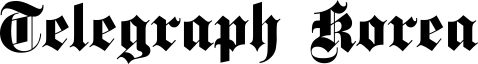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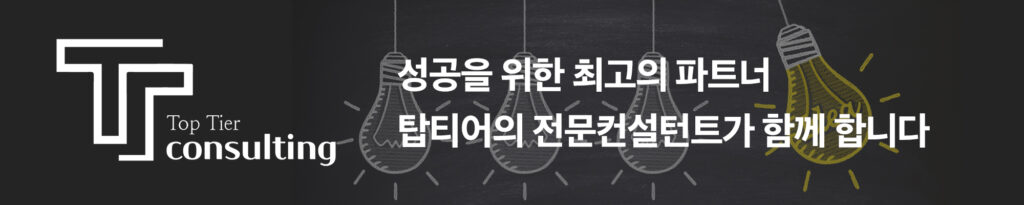

![[봉쌤의 책방]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불러오다 [봉쌤의 책방]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불러오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1/image-19.png)





![[기자수첩]5호선, ‘광역교통’ 본질 잃은 누더기 노선 경계해야](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3/0000028768_002_202312181314021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