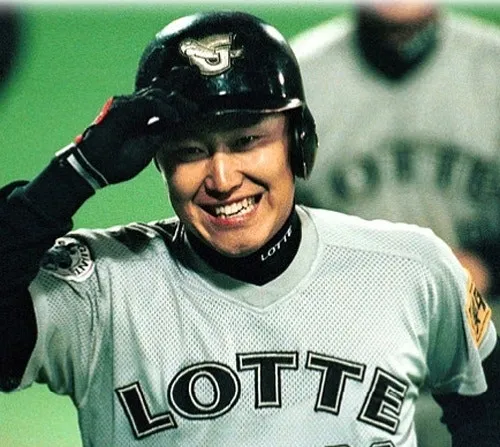![[사설] 능사능임(能事能任)의 원칙, 인사의 고전은 유효하다 [사설] 능사능임(能事能任)의 원칙, 인사의 고전은 유효하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61-1024x683.png)
정치는 늘 새 얼굴과 새 구호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국가를 실제로 움직이는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인사는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정치의 영역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파를 넘는 실용적 인사 기조는, 찬반을 넘어 우리 정치가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는 과연 누구를 써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정치의 요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곧은 사람을 들어 올려 굽은 사람들 위에 두고, 능력 있는 자로 하여금 일을 맡긴다(擧直錯諸枉, 能者使之).” 정치의 성패를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 그중에서도 인사의 기준에서 찾은 통찰이다. 이 생각은 후대에 ‘능사능임(能事能任)’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되었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라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실천되기 어려운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례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 바뀌는 것이 당연시돼 온 한국 정치에서, 전임 정부 장관의 유임은 관행을 거스르는 선택이다. 송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으나, 최소한 행정 경험과 정책 연속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설명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권 교체를 ‘청산’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로 바라보겠다는 인사 철학이 드러난다.
물론 유임이 곧 정책에 대한 면죄부일 수는 없다. 정책 성과와 책임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냉정해야 한다. 그러나 출신 정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능사능임과는 거리가 멀다. 인사의 기준이 정파가 되는 순간, 정치는 당동벌이(黨同伐異)의 늪에 빠진다. 내 편이면 눈감고, 상대편이면 배척하는 정치는 인사를 국정의 도구가 아니라 전리품으로 전락시킨다.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라는 평가와 “과거 행적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범여권 일부 정당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장면은 인사가 얼마나 쉽게 진영 감정의 시험대에 오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정파를 넘는 인사가 오히려 책임의 경계를 흐리고, 과거에 대한 단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할 만한 문제 제기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 인사 이후의 책임 정치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수행 권한이다. 그 권한을 정파 논리로 봉쇄한다면, 정책 실패의 책임 역시 누구도 질 수 없게 된다.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신 검증은 더 엄정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균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역할도 분명하다. 청문회는 낙마를 전제로 한 정치적 심판장이 아니라, 공직 수행 능력과 헌정 질서에 대한 인식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과거의 판단과 발언이 문제라면 설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검증의 목적이 배제가 되는 순간, 청문회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다.
정치는 결국 대국대의(大局大義)를 향해야 한다. 지지층의 감정과 당장의 유불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바른 사람을 세우고, 능한 자에게 일을 맡기라는 원칙은 결코 낡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의 정치가 가장 절실히 회복해야 할 기준이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과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쟁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을 시험하는 동시에 우리 정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다. 모든 인사 논쟁이 결국 진영 논리로 귀결된다면,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는 정파를 넘어 능사능임이라는 오래된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고전이 오늘의 정치에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top_tier_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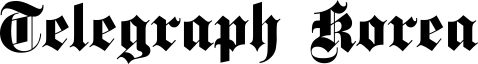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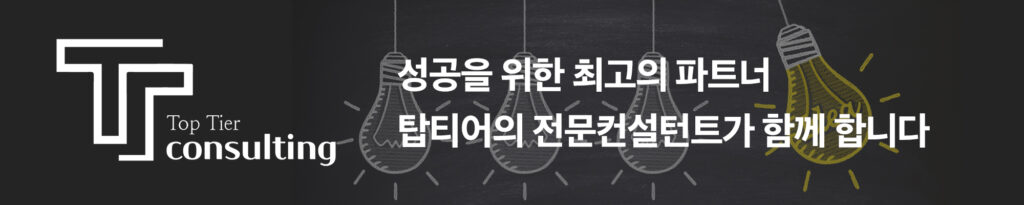






![[기자수첩]아직도 타봐야 아나, 한시가 급한 5호선 김포연장 전시행정으로 뭉개기 [기자수첩]아직도 타봐야 아나, 한시가 급한 5호선 김포연장 전시행정으로 뭉개기](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2/sdfsdf-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