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그맨’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떠난 전유성 [칼럼] ‘개그맨’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떠난 전유성](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09/IMG_3226.jpeg)
한국 방송 코미디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이름에 자연스레 다다른다. 전유성.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웃긴 희극인이 아니라, ‘개그맨’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통해 한국 코미디의 세대 교체를 이끌었던 상징적 인물이었다.
1960~70년대 한국 무대와 방송에서 웃음을 담당하던 이들을 우리는 ‘코미디언’이라 불렀다. 서영춘, 이주일로 이어지는 희극 전통은 주로 무대극과 만담, 시트콤적 연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일상화되고, 대중의 웃음 코드가 빠르게 변화하던 1980년대, 전유성은 그 흐름을 읽어냈다. 대학 개그 서클에서 발굴한 신예들과 함께 새로운 개그 형식을 선보이며, 그들을 ‘개그맨’이라 명명한 것이다. 일본 방송계에서 이미 쓰이던 단어였지만, 전유성의 손에서 그것은 단순한 차용을 넘어 한국적 정체성을 지닌 호칭으로 재탄생했다.
“우리는 코미디언과 다르다. 짧고 날렵한 개그로 무대를 장악한다.” 전유성이 그린 청사진은 곧 현실이 되었다. 「유머 1번지」, 「청춘행진곡」과 같은 공개 코미디 무대에서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을 단 젊은 희극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곧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이경규, 심형래, 최양락, 김미화, 김국진, 이봉원 등 수많은 개그맨들이 그의 손길을 거쳐 국민의 웃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전유성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웃음의 순간을 넘어선다. ‘코미디언’이란 정통적 희극인의 맥을 잇되, ‘개그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대의 감각을 껴안은 그의 통찰은, 예능과 희극이 뒤섞인 오늘날 방송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바로 구관이명(舊觀而明), 옛것을 보되 새롭게 밝히는 지혜라 할 만하다.
그가 무대를 떠난 지금, 우리는 한 코미디언의 부고가 아니라, 한 시대가 남긴 웃음의 기억을 애도한다. 그러나 ‘개그맨’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다. 웃음을 통해 세상을 비추고자 했던 전유성의 발자취는 후배들의 무대 위에서, 또 관객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이제 그는 무대 조명 대신 하늘빛 아래 서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웃음을 자라게 한다. 한국 코미디의 언어를 새롭게 빚어낸 개척자, 전유성. 그 이름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top_tier_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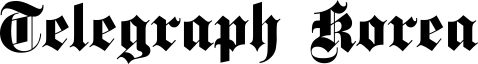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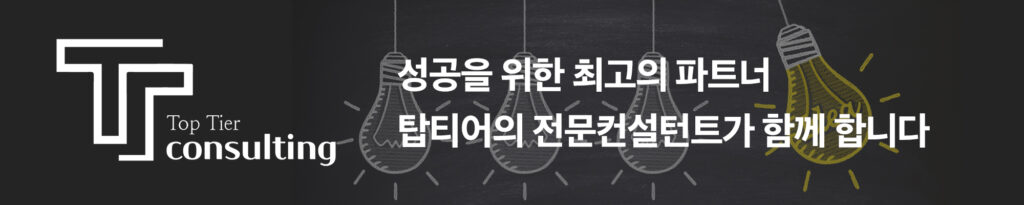
![[사설] 원화 약세와 무역 교착, 진퇴양난(進退兩難)의 한국 경제 [사설] 원화 약세와 무역 교착, 진퇴양난(進退兩難)의 한국 경제](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09/image-92-1024x747.png)
![[봉쌤의 책방] 지도가 들려주는 세계사의 숨은 이야기 [봉쌤의 책방] 지도가 들려주는 세계사의 숨은 이야기](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09/IMG_3228-1-1024x768.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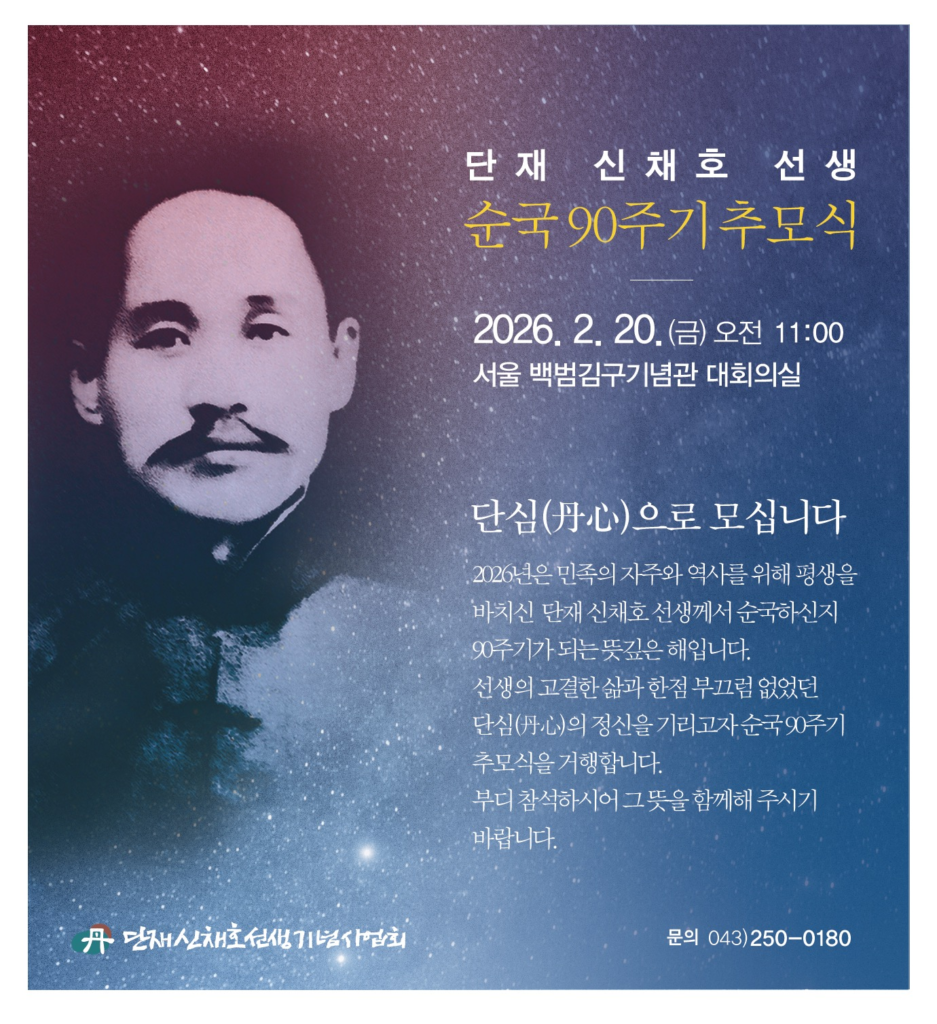

![[기자수첩] “숨 막혀 못 살겠다”…5호선연장 정치적 제동에 폭발한 김포의…](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2/그림2-2-170x3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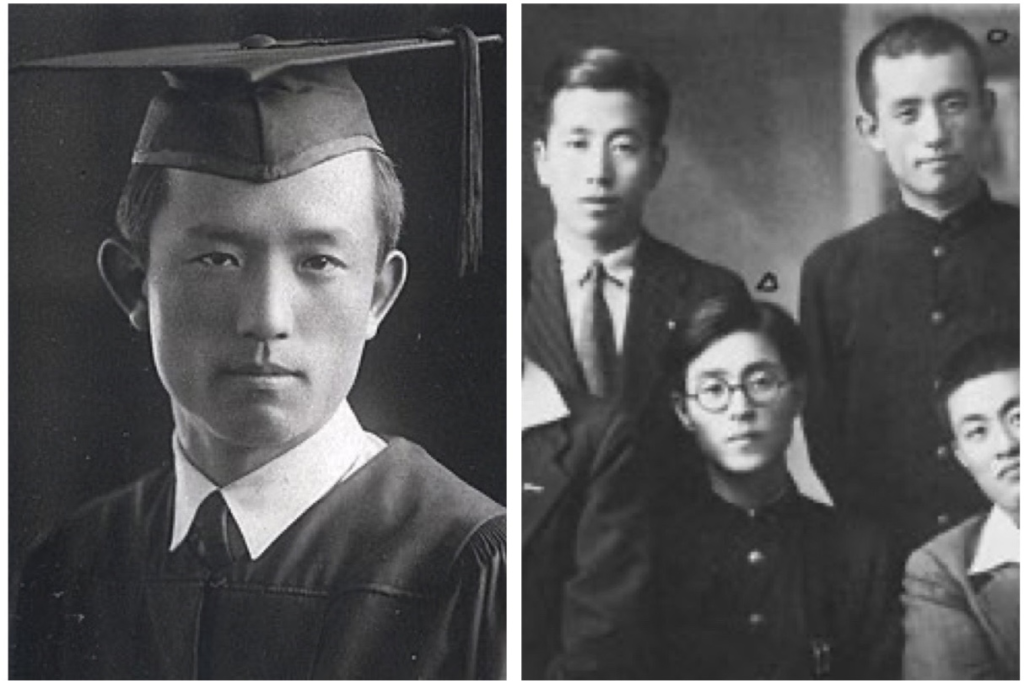
![[기자수첩] “숨 막혀 못 살겠다”…5호선연장 정치적 제동에 폭발한 김포의 설 민심](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2/그림2-2-600x6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