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여기 있는 희생자들을 이유도 없이 사살한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올 수 있나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을 찾은 강모(77)씨는 봉안실 내 위패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한(恨)을 토해냈다.
강씨는 “4·3 당시 토벌대가 동네 주민 중 젊은이들만 가려내 서귀포시 모슬포 주둔지로 끌고 갔는 데 그때 아버지도 잡혀갔다”며 “그리고 얼마 안 돼 모슬봉에서 집단학살 당했다”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강씨는 “그때 내가 2살 때였다”며 “70여 년이 흐르고 나서도 아직 아버지가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관련 기록도 없어 더욱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당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던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단 단체가 감히 희생자 영령을 모신 평화공원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양순자(81)씨도 이른 아침 남편과 함께 위패봉안실을 찾았다.
양씨는 4·3 당시 가족을 모두 잃었다. 양씨가 겨우 6살 때 일이다.
그의 가족은 그냥 집 밖으로 나갔다가 총살당했다. 당시 칼에 찔렸던 양씨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양유빈, 현경옥, 양정자, 양신자, 그리고 이름을 미처 갖기도 전 죽은 막내 남동생까지.
양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와 배를 꺼내 접시에 올리고 “몇십 년을 왔지만, 여기만 오면 그때 그 기억으로 심장이 떨린다”며 눈물을 훔쳤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날씨 탓에 모처럼 만에 추념식 당일 활짝 핀 벚꽃이 유족을 반겼다.

하지만 유독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 흩날리는 벚꽃 잎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제주의 봄을 대변하는 듯했다.
위패봉안실 인근 행방불명인 묘역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족 오병태(81)·오병남(79)씨는 큰형님 오병연씨 비석을 정성스레 닦고, 제사 지낼 음식을 준비했다.
제주 중산간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살던 이들은 4·3 당시 군·경이 무장대 소탕을 이유로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는 등의 토벌 작전을 벌이자, 마침 누님이 시집가는 성읍리로 피난을 떠나기로 했다.
오병연씨는 우리에 있던 소를 풀어주고 가족을 따라가기로 했지만, 그 후 행방불명됐다.
동생 오병태씨는 “죽은 줄 알았던 형님이 인천형무소에서 ‘며칠 뒤 돌아간다’는 내용의 엽서를 한 장 보냈다”며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행방불명됐다”고 설명했다.
오병남씨는 “그나마 지난해 5월 30일 재심에서 형님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세상이 달라졌음을 느꼈다”며 “판결문을 형님께 바치면서 이제라도 한을 푸시라고 했다. 4·3과 같은 아픔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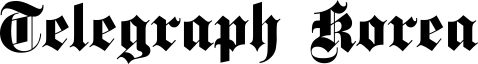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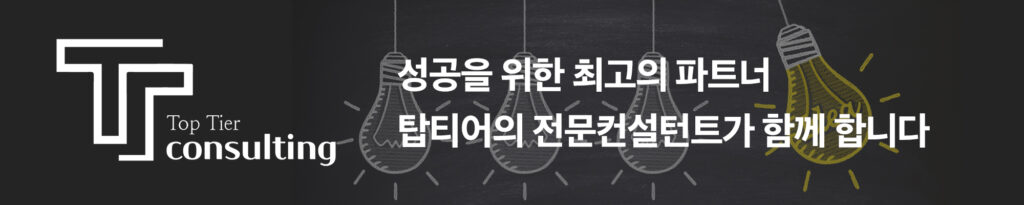
![[리얼미터 3월 5주 차 주간 동향]尹 대통령 긍정평가 36.7%(0.7%P↑) 3주간 지속됐던 하락세 멈춰 [리얼미터 3월 5주 차 주간 동향]尹 대통령 긍정평가 36.7%(0.7%P↑) 3주간 지속됐던 하락세 멈춰](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3/04/스크린샷-2023-04-02-오후-7.51.17-1024x615.png)


![[봉쌤의 책방] 문과의 언어로 과학을 읽는다는 것](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44-663x1024.png)
![[기억의 시간]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단한 한 사람의 시간](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G_5033-1024x768.jpeg)

![[봉쌤의 책방] 기억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 [봉쌤의 책방] 기억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23-1024x607.png)
![[기억의 시간] 427년 전의 침묵, 오늘의 대한민국에 말을 걸다 [기억의 시간] 427년 전의 침묵, 오늘의 대한민국에 말을 걸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28.png)
![[사설] 미국이었다면 불출석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사설] 미국이었다면 불출석은 선택지가 아니었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