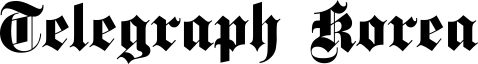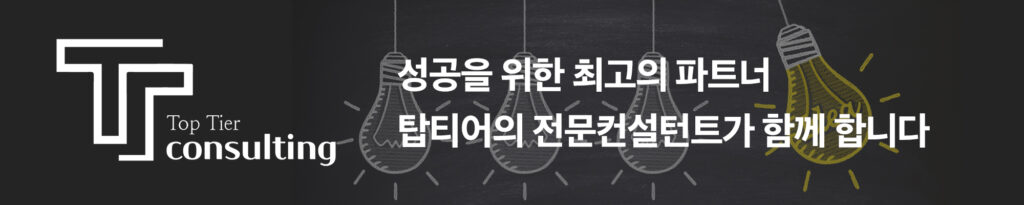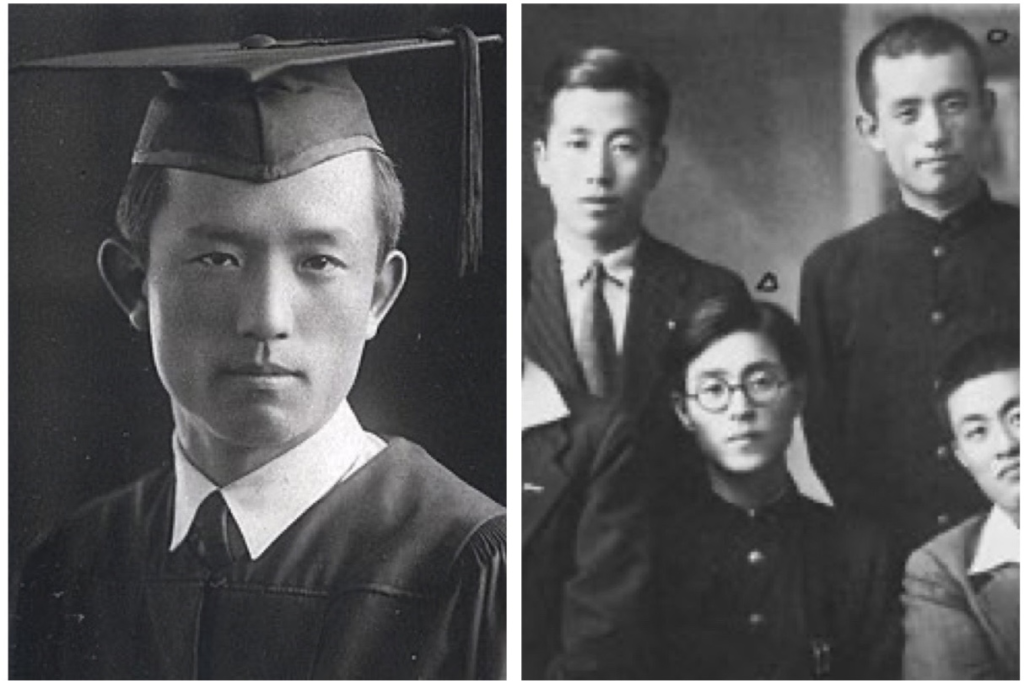2026년 새해, 텔레그래프코리아 편집장 인사
![[사설] 질문하는 언론을 시작하며 [사설] 질문하는 언론을 시작하며](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1/image-1-1024x574.png)
새해는 언제나 방향을 묻는 시간이다. 무엇을 더 빨리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더 깊이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텔레그래프코리아는 2026년의 연두(年頭), 스스로에게 분명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언론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텔레그래프코리아는 빠른 뉴스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미 세상은 충분히 빠르다. 속보는 넘치고, 자극은 과잉이며, 해명은 짧아지고 책임은 가벼워졌다. 그 속도 경쟁의 끝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우리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왜 그 질문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묻고자 한다.
권력은 늘 설명을 최소화하려 한다. 정치 권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거대 기업, 관료 조직, 플랫폼, 심지어 여론 그 자체도 불편한 설명을 줄이고 싶어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 “관행이었다”는 해명,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될수록, 설명은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책임은 사라진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그 설명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책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질문은 불편하다. 질문은 속도를 늦추고, 합의를 흔들며, 때로는 권위의 얼굴을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질문은 자주 생략된다. 그러나 질문 없는 편안함은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질문 없는 합리성은 결국 강자의 언어가 된다. 텔레그래프코리아는 질문 있는 불편함이 질문 없는 안온함보다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끝까지 묻는 태도를 갖고자 한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왜 책임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가, 왜 제도는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한 번의 기사로 끝내지 않고,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추적하는 언론이 되고자 한다.
이 신문은 독자에게도 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독자의 확신을 흔들 수 있고, 익숙한 진영 논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은 독자의 생각을 대변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독자가 미처 묻지 못한 질문을 대신 묻는 것, 그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2026년, 텔레그래프코리아는 속보보다 맥락을, 해명보다 책임을, 침묵보다 질문을 선택하겠다.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되, 시민과는 거리를 두지 않는 언론. 불편함을 감수하되, 포기하지 않는 언론. 질문이 끝까지 살아남는 신문을 지향하겠다.
새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이 신문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겠다. 그러나 필요한 길이라면 돌아가지 않겠다. 질문하는 언론, 텔레그래프코리아의 출발선에 함께 서 주시길 바란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