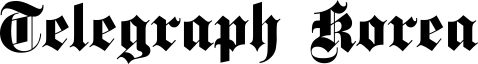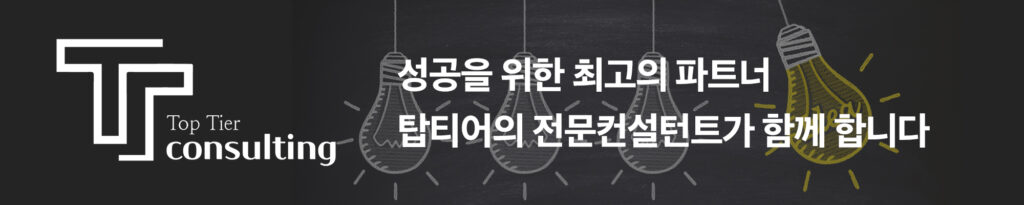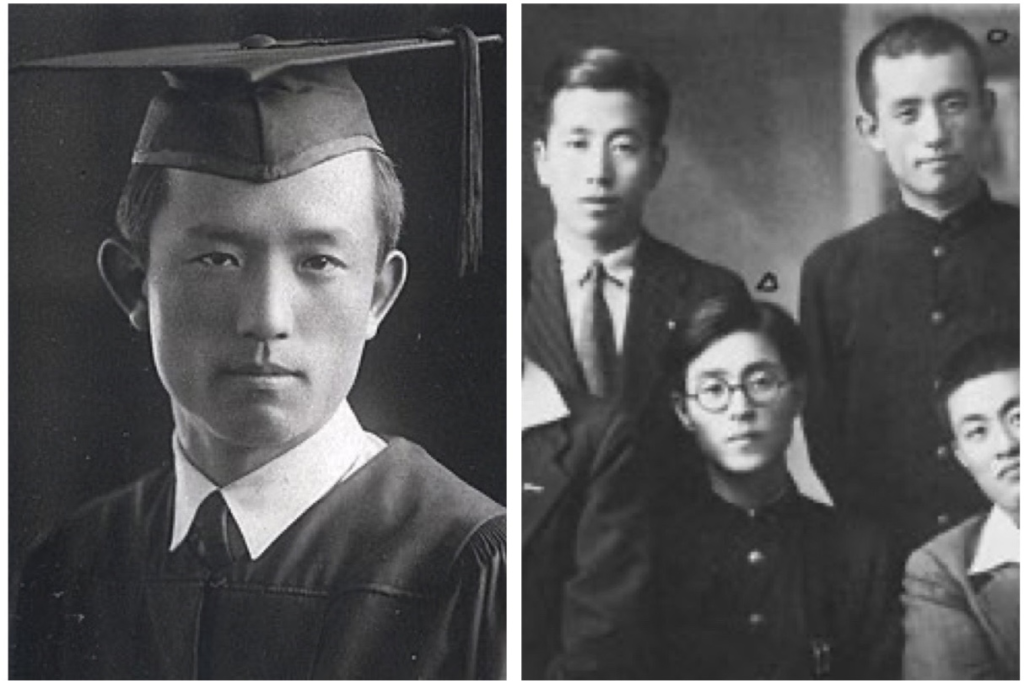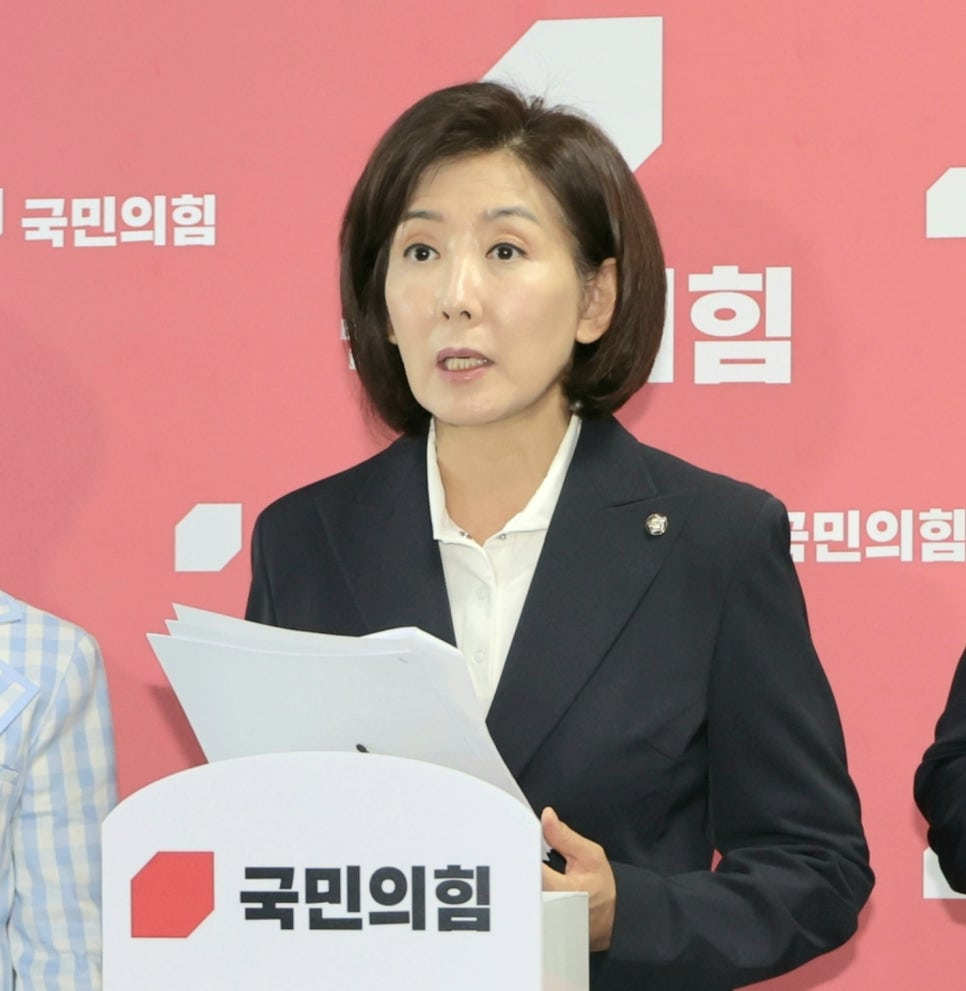![[사설] 병오년(丙午年), 세여파죽(勢如破竹) [사설] 병오년(丙午年), 세여파죽(勢如破竹)](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6/01/image-1024x683.png)
새해는 늘 선택을 요구한다. 멈출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병오년(丙午年)의 첫날은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다. 불의 기운을 지닌 병(丙)과 질주를 상징하는 오(午)의 결합은 관망보다 결단을, 주저보다 전진을 요구한다. 이 해의 화두로 세여파죽(勢如破竹)이 소환되는 이유다.
세여파죽은 『진서(晉書)』 두예전(杜預傳)에 나온 말이다. 서진의 장수 두예는 오나라 정벌을 앞두고 “병세가 이미 형성되면 대나무를 쪼개는 형세와 같아, 몇 마디만 넘기면 칼날을 맞아 저절로 갈라진다(兵勢已成 如破竹之勢 數節之後 迎刃而解)”고 했다. 이는 무작정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가 끝났다면 초반의 돌파를 주저하지 말되, 그 기세를 끝까지 책임으로 완주하라는 전략의 언어다.
이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흔히 관우가 소환된다. 그는 승패의 계산보다 ‘의(義)’를 기준으로 선택한 인물로 기억된다. 조조의 후대 속에서도 유비를 향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 선택이 초래할 위험과 대가를 감수했다. 백마 전투에서 단번에 안량을 참수한 장면은 준비된 돌파가 전선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관우의 일생이 오직 승리의 연속이었던 것은 아니다. 번성(樊城) 전투에서의 패배는, 의리와 기세만으로는 전쟁을 완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명분과 초기 돌파가 중요하듯, 이후의 관리와 판단, 현실 인식이 결여될 때 기세는 오히려 몰락의 속도가 될 수 있다. 세여파죽이 요구하는 것은 맹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연속이다.
적토마는 그 상징을 완성한다. 붉은 빛을 띠고 토끼처럼 빠르다는 이름 그대로, 적토마는 망설임 없이 달렸다. 그러나 그 질주는 방향 없는 속도가 아니었다. 주인을 알고 목적을 아는 질주였다. 그래서 적토마는 단순한 명마가 아니라, 기준을 잃지 않는 기세의 은유가 된다. 빠르되 흔들리지 않는 전진, 이것이 세여파죽이 요구하는 본질이다.
병(丙)은 불이고, 오(午)는 말이다. 불은 따뜻함이 될 수도, 화재가 될 수도 있다. 말의 질주는 도약이 될 수도, 추락이 될 수도 있다. 기준 없는 속도는 위험이지만, 원칙과 결합한 속도는 변화의 동력이 된다. 병오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지금의 기세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자. 지난해 우리 사회는 세여파죽의 비유를 정치 현실에서 경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헌정 질서를 근본에서 흔들었고, 탄핵과 조기 대선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국민의 집단적 선택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규범과 신뢰를 복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민생 회복과 제도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 과정을 공개하며 설명과 설득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타운홀 형식의 소통에 나선 장면은 국정을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회피보다 선택을 택한 태도 자체는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형성된 기세가 개혁의 명분에 취해 제도적 숙고를 건너뛰는 순간, 세여파죽은 다시 무모한 질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속도는 필요하지만, 속도가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는 믿음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뢰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질문은 여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야당 역시 새해 첫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의 반대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인지, 정쟁을 위한 소음인지 돌아볼 때다. 항해 중인 배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이지, 배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병오년의 새해 첫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다. 희망은 선언이 아니라 축적에서 나오고, 행복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에서 완성된다.
이미 형성된 기세를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으로 완주할 것인가. 2026년 병오년이 분열의 기억이 아니라 성취의 기록으로 남을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병오년의 불과 말이 파괴가 아니라 도약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를,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 희망이 일상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새해 첫날 우리는 함께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