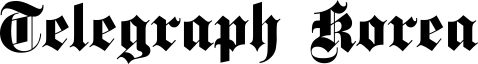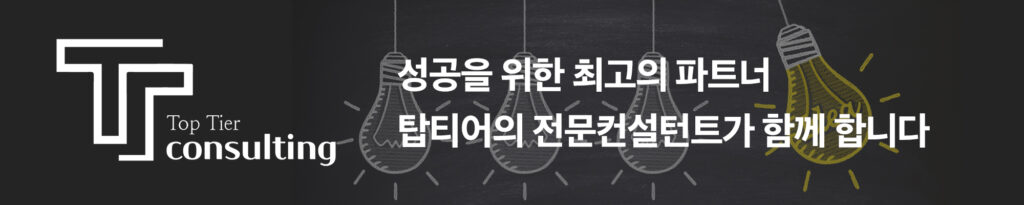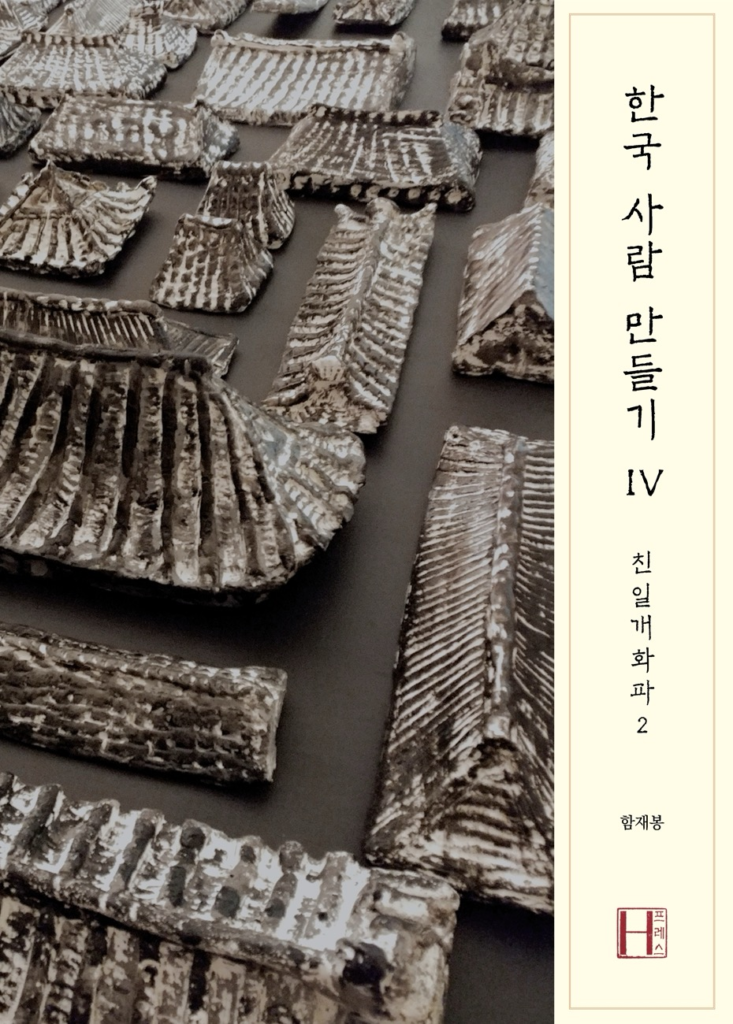![[사설] 수사·기소 분리, 법치주의를 가늠할 역사적 실험 [사설] 수사·기소 분리, 법치주의를 가늠할 역사적 실험](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0/image-6-1024x683.png)
내년 10월, 검찰청이 78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해체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그동안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는 검찰 권한을 둘러싼 논란의 뿌리였다. 이번 개편은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근본적 수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 혁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지난 수십 년간 권력형 비리 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역할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가 곧바로 정의와 공정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가 다른 기관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협력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크다. 증거 전달, 기소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면 오히려 범죄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한의 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이다.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두어지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낳았던 배경에는 권력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운영의 방식,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양 고전에서 말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편안함 속에서도 위기를 대비하라는 뜻이다. 검찰청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큰 분기점이지만, 이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다면 법 집행의 신뢰는 더 흔들릴 수 있다.
검찰 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나 그 성패는 제도의 간판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에 달려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하고, 투명한 제도 설계와 인사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법 질서를 세워야 한다. 신중한 기대와 함께 이번 변화가 법치주의의 토대를 더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top_tier_1@naver.com